수백만 마리 방류 사업의 성공, 그러나 어민 수익은 ‘빨간불’

가을 꽃게가 풍년을 맞았지만 정작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어획량이 많을수록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풍성한 수확이 어째서 조업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지로 이어지는 것일까. 핵심은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익성 악화 문제에 있다.
금어기 해제 후 쏟아지는 어획량

2025년 여름 꽃게 금어기(통상 6월 21일~8월 20일)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서해 앞바다는 그야말로 꽃게의 바다로 변했다. 충남 서천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그물을 올릴 때마다 만선의 기쁨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조업 현장에서는 첫 번째 그물에서만 약 45~50kg에 달하는 꽃게가 올라왔다. 마릿수로는 150~200마리에 이르는 상당한 양이다. 어민은 금어기 직후와 비교해 어획량이 다소 줄었음에도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한다.
‘풍년의 저주’ 부르는 노동 집약적 조업

문제는 조업 방식의 특수성에서 발생한다. 꽃게는 통발이 아닌 자망(걸그물)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꽃게가 다리와 몸통이 그물코에 복잡하게 엉킨 채로 올라온다.
좁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를 일일이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그물 전체를 항구로 가져와 육상에서 수작업으로 떼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한 어민은 당일 잡은 양의 4분의 1만 정리했음에도 30~40kg에 달했다고 전했다. 단기간에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면 경매 가격은 자연히 하락한다. 결국 어획량 증가가 그물 해체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잡을수록 손해’인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다.
자원 회복 노력의 빛과 그림자

이러한 꽃게 풍년은 우연이 아닌 계획된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물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은 매년 서해 주요 연안에 수백만에서 수천만 마리의 어린 꽃게(치게)를 방류하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
어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자원 회복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꽃게 자원량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으며, 이는 올해 주꾸미 조황이 역대급으로 좋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자원 회복이라는 ‘빛’이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이라는 ‘그림자’를 만들면서 어업 경영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엇갈리는 이해관계와 남은 과제

꽃게 풍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엇갈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을 제철 꽃게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품질 좋은 국산 꽃게의 소비가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한다.
반면 생산자인 어민에게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일각에서는 조업 중 그물이 통째로 사라지는 절도 사건까지 발생하며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원 조성의 성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수매 및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어획량 조절과 가공·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어민 소득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해안 꽃게 풍년의 역설은 국내 수산업이 자원 회복 단계를 넘어 시장 안정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바다를 ‘천연 양식장’으로 가꾸는 노력의 성공이 어민들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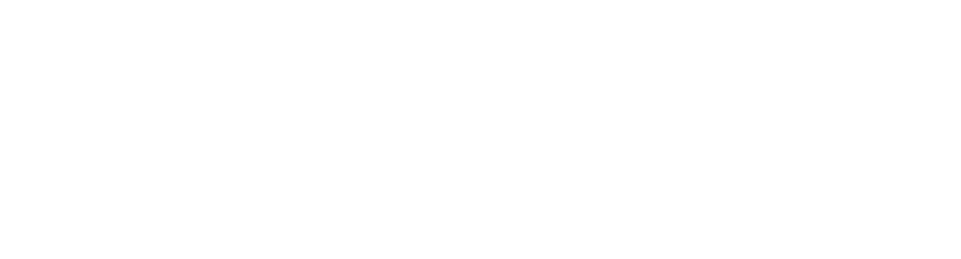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