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녹음 현상과 기후 변화가 만든 오분자기 절멸 위기

여름의 절정, 복날이 다가오면 으레 땀 흘린 몸을 보할 음식을 찾게 된다. 많은 이들이 장어와 전복을 떠올리지만, 제주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이 먼저 스치는 이름이 있다.
한때 전복보다 흔해 ‘서민들의 보양식’으로 불렸던 오분자기다. 된장을 푼 뚝배기에서 구수하게 끓어오르던 그 작은 해산물은 이제 제주에서도 가장 귀한 식재료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과거 1kg에 1~2만 원이면 족했던 가격은 이제 전복을 훌쩍 뛰어넘어 8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 얼핏 보면 전복과 꼭 닮았지만, 오분자기는 엄연히 다른 종이다.
전복의 껍데기가 짙은 녹색을 띠며 4~5개의 울퉁불퉁 솟아오른 호흡공을 가진 반면, 오분자기는 다홍빛이 감도는 껍데기에 7~8개의 구멍이 평평하게 뚫려있다.
제주의 따뜻하고 수심 얕은 바위틈에서 미역과 감태 등 해조류를 먹고 자라는 아열대성 생물로, 제주 바다의 생태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통계가 증명하는 절멸의 위기

오분자기의 실종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는 비극적인 현실을 수치로 증명한다.
1995년 159톤에 달했던 제주 연안의 오분자기 채취량은 2000년대 들어 급감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27톤까지 쪼그라들었다. 이후로는 연간 3톤 안팎을 기록하며 사실상 자연산의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다.

현재 우리가 식당에서 어렵게 마주하는 오분자기의 상당수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한 종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주 여행의 필수 코스는 단연 오분자기 뚝배기였다. 구수한 된장 국물 속에서 쫄깃하게 씹히는 오분자기의 맛은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별미였다.
하지만 이제 그 맛은 몇몇 향토 음식점에서만 겨우 맛볼 수 있는 추억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다. 양식을 통해 자원을 회복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잦은 태풍과 낮은 경제성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바다 사막화, ‘갯녹음’이 식탁을 위협하다

그 많던 오분자기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해양 전문가들은 주된 원인으로 ‘갯녹음(백화현상)’을 지목한다. 갯녹음이란 바위가 하얗게 변하며 해조류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는 일종의 ‘바다 사막화’ 현상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탄산칼슘이 바위에 달라붙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 본질은 기후 변화와 맞닿아 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제주 연안에는 무절석회조류라는 딱딱한 석회질 성분의 조류가 빠르게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 조류가 바위 표면을 마치 시멘트처럼 뒤덮어 버리면서, 미역이나 감태 같은 대형 해조류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게 된 것이다.
오분자기의 주식이었던 해조류 숲이 사라지자, 먹이터와 산란장, 은신처를 모두 잃은 오분자기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따뜻해진 바다는 오분자기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셈이다.
짧게 끓여야 진짜 맛… 사라져가는 제주의 맛

지금도 몇몇 식당의 메뉴판에 남아 있는 오분자기 뚝배기는 그래서 더 귀하게 느껴진다. 오분자기는 전복보다 크기는 작아도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응축된 감칠맛을 자랑한다. 이 맛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서는 조리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분자기는 오래 가열하면 질겨진다. 이는 풍부한 콜라겐과 단백질이 높은 열에 급격히 수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뚝배기가 한소끔 끓어오를 때 가장 마지막에 넣어, 1~2분 내외로 짧게 익혀내는 것이 탱글탱글한 식감을 살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조리된 오분자기는 다른 해산물과 된장이 어우러진 시원한 국물과 함께 입안에서 터지듯 바다의 향을 선사한다.
한 그릇의 오분자기 뚝배기를 맛보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때 풍요로웠던 제주 바다에 대한 기억이자, 변해버린 해양 생태계가 우리 식탁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다.
복날의 보양식 목록에서조차 희미해져 가는 오분자기의 이름은,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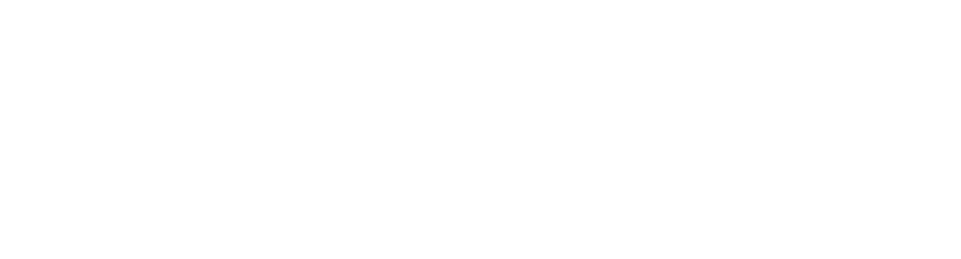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