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혔던 토종 앉은뱅이밀이 세계 식량난을 구한 유전자로 재조명되고 있다

전 세계 수억 명을 기아에서 구한 ‘녹색 혁명’의 시작이 한반도의 토종 곡물에서 비롯되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는 사실이다. 키가 작아 ‘앉은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혔던 한 토종밀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곡물은 20세기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결정적 유전자원으로 활약하며 역사를 바꿨다. 한때 우리 땅에서 흔했던 앉은뱅이밀은 기원전부터 재배된 역사를 지녔지만, 1980년대 이후 값싼 수입 밀에 밀려 거의 자취를 감췄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곡물이 한국에서 사라져 갈 무렵, 바다 건너에서는 인류의 식량 지도를 바꾸는 위대한 혁명을 이끌고 있었다.
세계사를 바꾼 토종 유전자의 여정

앉은뱅이밀의 운명이 바뀐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농업 자원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앉은뱅이밀의 잠재력을 발견했다.
키가 50~80cm에 불과해 강한 비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고(내도복성), 척박한 땅에서도 많은 수확량을 내는 특성에 주목한 것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앉은뱅이밀은 품종 개량을 거쳐 ‘농림10호(Norin 10)’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진정한 드라마는 그 이후에 시작됐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농학자이자 식물병리학자인 노먼 볼로그 박사는 당시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던 멕시코에서 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에서 ‘농림10호’를 도입해 멕시코 재래종과 교배시키는 혁신을 시도했다. 이 교배를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소노라 64(Sonora 64)’ 품종이다.
이 신품종은 앉은뱅이밀의 단간(短稈, short-culm)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 비료를 많이 주어도 키만 웃자라 쓰러지는 대신, 모든 영양분을 알곡으로 보내 폭발적인 수확량 증가를 이뤄냈다. 그 결과 멕시코는 불과 몇 년 만에 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했다.
녹색 혁명의 불씨가 되다

볼로그 박사의 성공은 멕시코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소노라 64’를 파키스탄과 인도 등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다른 국가들에도 보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인도의 밀 생산량은 1965년 1,230만 톤에서 1970년 2,010만 톤으로 급증했다. 이 경이적인 식량 증산의 물결이 바로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이다.
노먼 볼로그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한반도의 작은 토종밀이 전 세계 식탁을 풍요롭게 만든 역사적 순간이었다.
고향에서 마주한 위기와 부활

하지만 정작 고향인 한국에서 앉은뱅이밀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 1982년 밀 수입 자유화 조치와 1984년 정부의 밀 수매 중단은 국내 밀 생산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값싼 수입 밀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밀 농가는 설 자리를 잃었고, 앉은뱅이밀 역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1990년대 시작된 ‘우리밀살리기운동’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당시 운동은 주로 글루텐 함량이 높은 경질밀인 ‘금강밀’과 ‘조경밀’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 때문에 ‘한국산 밀은 맛이 없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오히려 글루텐이 적고 부드러운 연질밀인 앉은뱅이밀까지 외면받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재 앉은뱅이밀은 경남 진주시 금곡면을 중심으로 소중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연간 약 120톤이 생산되며,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그 품질을 아는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전량 판매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글루텐 함량이 낮아 소화가 잘되고,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주목받는다. 한국이 잠시 외면했던 토종 곡물 앉은뱅이밀이 세계 식량사를 바꾼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유전자원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가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수천 년간 한반도 기후에 적응해 온 앉은뱅이밀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작은 거인의 귀환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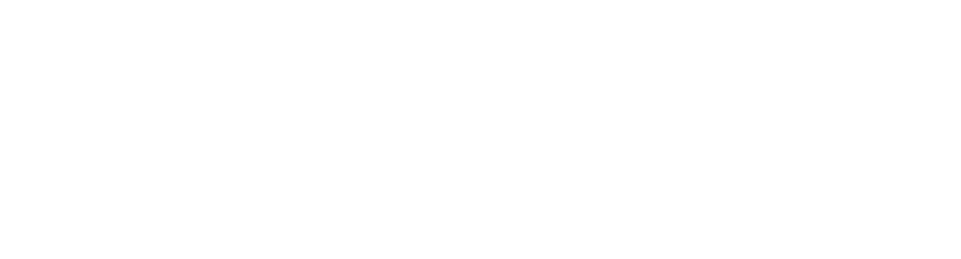
어릴때많이심은것 보았는데 이것이 참밀 인것으로 아는데 이게 밀가루로 만들어 국수도 만들어 먹은기역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