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채소’라 불렸던 녹색의 배신 ‘컴프리’ 유행과 금지의 전말

‘밭에서 나는 우유’, ‘채소 중의 채소’. 한때 이토록 극진한 찬사를 받으며 식탁 위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식물이 있다. 유럽 캅카스 지역이 원산지인 여러해살이풀 컴프리(Comfrey).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앞세워 1960년대 한국에 상륙한 뒤, 녹즙과 나물, 튀김 등 다양한 형태로 건강을 추구하는 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시대는 2001년, 하나의 발표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기적의 식물’이 하루아침에 ‘간을 파괴하는 발암물질’로 전락한 것이다. 도대체 컴프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광의 시대: 만병통치약으로 떠오른 ‘컴프리’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컴프리는 한번 심으면 수십 년간 자라며 풍성한 잎을 내어준다. 원산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잎을 갈아 빵을 만들거나 약용으로 사용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기는 대단했다. 한방에서는 뿌리와 잎을 ‘감부리’라 부르며 위장 질환이나 피부염 등에 처방했고, 민간에서는 각종 요리의 재료로 활용했다.
특히 컴프리 열풍에 불을 지핀 것은 ‘간 질환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 과학적 검증은 없었지만, 이 위험한 믿음은 오히려 간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큰 사람들을 컴프리로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 혹은 병을 낫기 위해 더 열심히 컴프리를 섭취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과학의 경고: 간을 파괴하는 독소의 발견

컴프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과학계의 경고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제의 핵심은 컴프리 속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라는 독성 물질이었다.
이 물질은 섭취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체내에 들어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강력한 독성 화합물로 변모한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손상이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축적된다는 사실이다.
컴프리를 오래 먹을수록 간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되며, 이는 결국 간의 미세 혈관들이 막히는 간정맥폐쇄증이나 간경변, 나아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독소 함량은 갓 자라난 어린잎에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부드러운 잎을 나물로 즐겼던 식문화에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세계적인 퇴출과 남겨진 교훈

이러한 유해성이 입증되자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허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한 독일의 보건 당국이 선제적으로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고, 200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컴프리를 함유한 식이보충제의 판매를 금지하며 “컴프리가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같은 해에 FDA가 지목한 주요 컴프리 종(Symphytum officinale 등)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백승운 전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과거 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컴프리에는 간 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며 “서양에서는 (식용 목적의) 재배조차 금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간염 치료제로 둔갑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컴프리의 식용 및 내복용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엄격한 규제 하에 타박상이나 관절 염증 완화를 위한 외용 연고(피부에 바르는 약) 성분으로 극소량 사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는 상처가 없는 피부를 통한 흡수율이 먹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지만, 이마저도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때 식탁 위의 총아였던 컴프리의 추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자연에서 온 것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막연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효능만 부풀린 이야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건강 정보가 범람하는 오늘날, 우리는 컴프리 사태를 통해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하고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되새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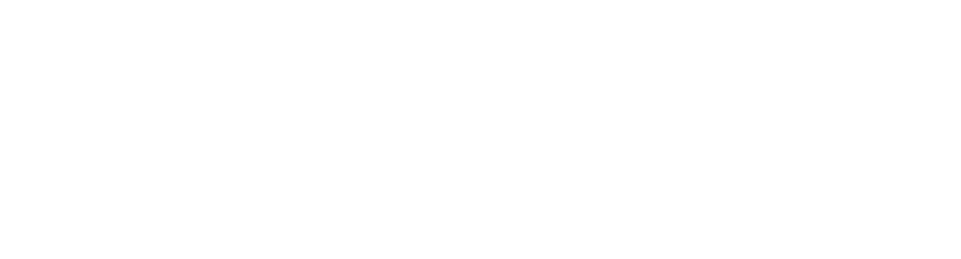
전체 댓글 0